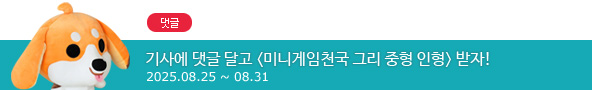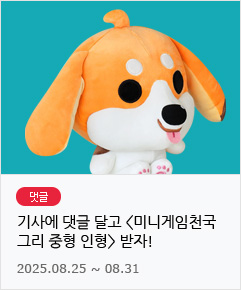녹스가 붙잡은 토끼, 액션
`디아블로 2 킬러`라는 광고문구만으로도 녹스는 우리의 시선을 집중시켜 왔다. 많은 게이머들이 이 게임의 출시를 기다려 왔고 늘어지는 디아블로 2의 발매 연기는 녹스에 더없는 호재로 작용했다. 그리고 이제 그 결과물이 바로 눈앞에 있다. 녹스는 과연 디아블로 2의 위치를 대체할 만한 게임인가?
콜롬버스의 달걀은 어떤 영역이든 선구자의 역할이 얼마나 많은 피와 땀을 요구하는지 나타내주는 표현이다. 아쉽지만 녹스에서 새로운 달걀의 모습은 찾아볼 수 없다. 침체 상태에 빠져있던 롤플레잉계에 액션이라는 돌파구를 제시한 디아블로가 하나의 혁명이었다면 녹스는 선배 디아블로가 닦아놓은 길을 한층 굳게 다지는 역할을 하고 있을 따름이다.
따라서 녹스의 본령은 거창한 게임사적인 의미가 아닌 다른 곳에서 찾아야 한다. 그것은 바로 게임 본연의 자세로 돌아가 치열하게 재미를 추구하고 있다는 점이다. 누구든 녹스의 세계로 모험을 떠나는데 있어 10분 이상의 준비 시간을 요하지는 않을 것이다. 초보 게이머들을 겁먹게 만드는 캐릭터 설정, 수많은 메뉴와 인터페이스의 습득, 번거로운 대화는 제거되거나 극도로 간소화되어 있다. 간간이 등장하는 퀴즈에도 머리를 짓누르는 무게는 느껴지지 않는다. 완벽에 가까운 한글화는 보너스! 게이머들은 그저 치고 달리고, 마법을 쓰거나 몬스터를 소환하면서 헤쿠바와의 최후 결전을 향해 돌진하면 된다. 많은 롤플레잉 게임이 망각하고 있던 `누구나 부담 없이 즐길 수 있는 재미`가 녹스에서는 아주 명쾌하게 재현되고 있는 것이다.
그러면서도 녹스의 액션은 마냥 단순한 수준에서는 한 걸음 비껴나고 있다. 움직이는 자폭탄인 비스트나 함정의 활용, 상황에 맞춰 사용해야 할 특수기술 등은 게임을 한층 아기자기하게 만들고 전사, 소환사, 마법사의 각 캐릭터들은 게이머에게 플레잉 스타일의 차별화를 요구한다. 같은 장소, 같은 몬스터를 상대하더라도 조종하는 캐릭터에 따라 게이머는 전혀 다른 플레이 경험과 느낌을 갖게 된다. 아울러 시야를 `현실적으로` 제한하는 트루 사이트 시스템(True sight system)은 몬스터들과의 갑작스런 조우에서 오는 긴장감을 한층 강조하고 있다.
액션에의 추구가 가장 노골적으로 드러나는 것은 멀티플레이에서다. 디아블로가 싱글플레이에서 배제시켰던 파티 시스템을 멀티에서 찾아 롤플레잉으로 완성한 반면 녹스는 전혀 반대의 노선을 취한다. `깃발 뺏기(Capture the flag)`나 `어리너 데스(Arena death)` 등 모두 다섯 가지 모드가 제공되는 녹스의 멀티플레이는 철저하게 퀘이크나 언리얼 토너먼트의 문법을 따르고 있다. 게이머가 자유롭게 설정할 수 있는 키 배열은 녹스의 혈통 속에 퀘이크의 피가 섞여 들어갔음을 증명하는 것이다. 그나마 남아있던 롤플레잉의 자취는 멀티에서 완전히 거세되면서 녹스는 순수한 액션 게임으로 탈바꿈한다.
녹스가 놓쳐버린 토끼, 시나리오
녹스에서 액션의 강조가 시나리오의 약화를 뜻함은 아쉬운 일이다. 특이하게도 인스톨 화면을 빌어 설명되는 게임의 세계관은 전형적이고 진부하다. 하지만 오즈의 마법사의 도로시처럼 현시대의 주인공이 헤쿠바에 의해 우연히 녹스의 세계로 빨려 들어오는 게임의 도입부는 제법 흥미를 자극한다. 아무 내세울 것이 없어 보이는 평범한 주인공 잭(Jack)의 모습은 우락부락한 영웅들에 지친 눈에 신선해 보이기까지 한다. 문제는 그 신선함이 지속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잭은 느닷없이 강인한 전사, 영리한 소환사, 가공할 마법사가 되어 녹스의 세계를 종횡무진 누비고 다닌다. 왜 하필 잭이 세계를 구하는 영웅으로 선택되었는지는 엔딩을 보고 나서도 알 도리가 없다. 그저 집으로 돌아가기 위해 시키는 대로 이리저리 뛰어 다니는 잭의 활약은 분명 눈부시지만 별다른 당위성을 느낄 수가 없어 밋밋한 감흥만을 전해준다. 주인공이 이러니 다른 인물들이야 더 말할 나위가 없다. 헤쿠바가 일족의 복수를 결심하게 되기까지의 심리 과정, 헤쿠바를 구해냈던 잔도가 자신의 행위가 빚어낸 결과에 대해 맞을 고뇌 등 일반적인 롤플레잉에서 기대될 법한 갈등은 존재하지 않는다. 스토리는 일직선으로 나열되고 당연히 진행에 따른 깊이도 느낄 수 없다. 대사는 고풍스럽고 유려하지만 이마저 무개성의 캐릭터들 입을 거치니 화려한 말장난으로 전락해 버린다.
놀라운 일이지만 이런 약점(롤플레잉으로서는 치명적이랄 수 있는)은 막상 게임의 플레이에 별다른 영향을 주지 않는다. 녹스가 주는 순수한 액션의 재미가 그 모든 결점을 덮어버리고 있는 것이다. 몇 백억원을 투자해 2시간의 흥분과 스릴을 전해주는 헐리우드 액션 영화들처럼 철저하게 재미라는 `게임의 법칙`에 충실한 녹스가 상업적인 성공을 거두고 있음은 어찌 보면 당연한 결과다.
`나는 누구인가?`…, 고민할 필요가 있을까?
기나긴 재미의 궤적 뒤에 남겨지는 것은 녹스라는 게임의 정체성에 대한 의문이다. 게이머들은 자신의 취향에 따라 녹스를 롤플레잉 혹은 액션으로 자유롭게 구분할 수 있을 것이다. 이는 곧 받아들이는 사람에 따라 이도 저도 아닌 어중간한 게임으로 해석될 수 있음을 뜻한다. 롤플레잉이나 액션의 필터를 통과한 녹스의 결정은 결코 일류의 향기를 풍기지 않는다. 양쪽 중 어느 장르의 진화나 발전에도 녹스가 따로 특기할 만한 공헌을 하고 있다고는 말하기 힘들다.
그런데 그 결정들을 혼합하면 기묘하게도 일급의 재미를 지닌 게임으로 거듭난다. 녹스가 게임으로서 가장 큰 파워를 가질 수 있는 곳은 바로 장르의 경계가 무시되는 교차점의 영역 안에서인 것이다. 녹스의 최대 장점이자 미덕은 그 장르 파괴의 과정을 `재미`로 정면 돌파하고 있다는 점이다. 비록 디아블로가 지녔던 강렬한 카리스마는 없지만 게임 본연의 임무인 재미의 전달에 있어 녹스는 제 몫을 다하고 있는 작품이다.
`디아블로 2 킬러`라는 광고문구만으로도 녹스는 우리의 시선을 집중시켜 왔다. 많은 게이머들이 이 게임의 출시를 기다려 왔고 늘어지는 디아블로 2의 발매 연기는 녹스에 더없는 호재로 작용했다. 그리고 이제 그 결과물이 바로 눈앞에 있다. 녹스는 과연 디아블로 2의 위치를 대체할 만한 게임인가?
콜롬버스의 달걀은 어떤 영역이든 선구자의 역할이 얼마나 많은 피와 땀을 요구하는지 나타내주는 표현이다. 아쉽지만 녹스에서 새로운 달걀의 모습은 찾아볼 수 없다. 침체 상태에 빠져있던 롤플레잉계에 액션이라는 돌파구를 제시한 디아블로가 하나의 혁명이었다면 녹스는 선배 디아블로가 닦아놓은 길을 한층 굳게 다지는 역할을 하고 있을 따름이다.
따라서 녹스의 본령은 거창한 게임사적인 의미가 아닌 다른 곳에서 찾아야 한다. 그것은 바로 게임 본연의 자세로 돌아가 치열하게 재미를 추구하고 있다는 점이다. 누구든 녹스의 세계로 모험을 떠나는데 있어 10분 이상의 준비 시간을 요하지는 않을 것이다. 초보 게이머들을 겁먹게 만드는 캐릭터 설정, 수많은 메뉴와 인터페이스의 습득, 번거로운 대화는 제거되거나 극도로 간소화되어 있다. 간간이 등장하는 퀴즈에도 머리를 짓누르는 무게는 느껴지지 않는다. 완벽에 가까운 한글화는 보너스! 게이머들은 그저 치고 달리고, 마법을 쓰거나 몬스터를 소환하면서 헤쿠바와의 최후 결전을 향해 돌진하면 된다. 많은 롤플레잉 게임이 망각하고 있던 `누구나 부담 없이 즐길 수 있는 재미`가 녹스에서는 아주 명쾌하게 재현되고 있는 것이다.
그러면서도 녹스의 액션은 마냥 단순한 수준에서는 한 걸음 비껴나고 있다. 움직이는 자폭탄인 비스트나 함정의 활용, 상황에 맞춰 사용해야 할 특수기술 등은 게임을 한층 아기자기하게 만들고 전사, 소환사, 마법사의 각 캐릭터들은 게이머에게 플레잉 스타일의 차별화를 요구한다. 같은 장소, 같은 몬스터를 상대하더라도 조종하는 캐릭터에 따라 게이머는 전혀 다른 플레이 경험과 느낌을 갖게 된다. 아울러 시야를 `현실적으로` 제한하는 트루 사이트 시스템(True sight system)은 몬스터들과의 갑작스런 조우에서 오는 긴장감을 한층 강조하고 있다.
액션에의 추구가 가장 노골적으로 드러나는 것은 멀티플레이에서다. 디아블로가 싱글플레이에서 배제시켰던 파티 시스템을 멀티에서 찾아 롤플레잉으로 완성한 반면 녹스는 전혀 반대의 노선을 취한다. `깃발 뺏기(Capture the flag)`나 `어리너 데스(Arena death)` 등 모두 다섯 가지 모드가 제공되는 녹스의 멀티플레이는 철저하게 퀘이크나 언리얼 토너먼트의 문법을 따르고 있다. 게이머가 자유롭게 설정할 수 있는 키 배열은 녹스의 혈통 속에 퀘이크의 피가 섞여 들어갔음을 증명하는 것이다. 그나마 남아있던 롤플레잉의 자취는 멀티에서 완전히 거세되면서 녹스는 순수한 액션 게임으로 탈바꿈한다.
녹스가 놓쳐버린 토끼, 시나리오
녹스에서 액션의 강조가 시나리오의 약화를 뜻함은 아쉬운 일이다. 특이하게도 인스톨 화면을 빌어 설명되는 게임의 세계관은 전형적이고 진부하다. 하지만 오즈의 마법사의 도로시처럼 현시대의 주인공이 헤쿠바에 의해 우연히 녹스의 세계로 빨려 들어오는 게임의 도입부는 제법 흥미를 자극한다. 아무 내세울 것이 없어 보이는 평범한 주인공 잭(Jack)의 모습은 우락부락한 영웅들에 지친 눈에 신선해 보이기까지 한다. 문제는 그 신선함이 지속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잭은 느닷없이 강인한 전사, 영리한 소환사, 가공할 마법사가 되어 녹스의 세계를 종횡무진 누비고 다닌다. 왜 하필 잭이 세계를 구하는 영웅으로 선택되었는지는 엔딩을 보고 나서도 알 도리가 없다. 그저 집으로 돌아가기 위해 시키는 대로 이리저리 뛰어 다니는 잭의 활약은 분명 눈부시지만 별다른 당위성을 느낄 수가 없어 밋밋한 감흥만을 전해준다. 주인공이 이러니 다른 인물들이야 더 말할 나위가 없다. 헤쿠바가 일족의 복수를 결심하게 되기까지의 심리 과정, 헤쿠바를 구해냈던 잔도가 자신의 행위가 빚어낸 결과에 대해 맞을 고뇌 등 일반적인 롤플레잉에서 기대될 법한 갈등은 존재하지 않는다. 스토리는 일직선으로 나열되고 당연히 진행에 따른 깊이도 느낄 수 없다. 대사는 고풍스럽고 유려하지만 이마저 무개성의 캐릭터들 입을 거치니 화려한 말장난으로 전락해 버린다.
놀라운 일이지만 이런 약점(롤플레잉으로서는 치명적이랄 수 있는)은 막상 게임의 플레이에 별다른 영향을 주지 않는다. 녹스가 주는 순수한 액션의 재미가 그 모든 결점을 덮어버리고 있는 것이다. 몇 백억원을 투자해 2시간의 흥분과 스릴을 전해주는 헐리우드 액션 영화들처럼 철저하게 재미라는 `게임의 법칙`에 충실한 녹스가 상업적인 성공을 거두고 있음은 어찌 보면 당연한 결과다.
`나는 누구인가?`…, 고민할 필요가 있을까?
기나긴 재미의 궤적 뒤에 남겨지는 것은 녹스라는 게임의 정체성에 대한 의문이다. 게이머들은 자신의 취향에 따라 녹스를 롤플레잉 혹은 액션으로 자유롭게 구분할 수 있을 것이다. 이는 곧 받아들이는 사람에 따라 이도 저도 아닌 어중간한 게임으로 해석될 수 있음을 뜻한다. 롤플레잉이나 액션의 필터를 통과한 녹스의 결정은 결코 일류의 향기를 풍기지 않는다. 양쪽 중 어느 장르의 진화나 발전에도 녹스가 따로 특기할 만한 공헌을 하고 있다고는 말하기 힘들다.
그런데 그 결정들을 혼합하면 기묘하게도 일급의 재미를 지닌 게임으로 거듭난다. 녹스가 게임으로서 가장 큰 파워를 가질 수 있는 곳은 바로 장르의 경계가 무시되는 교차점의 영역 안에서인 것이다. 녹스의 최대 장점이자 미덕은 그 장르 파괴의 과정을 `재미`로 정면 돌파하고 있다는 점이다. 비록 디아블로가 지녔던 강렬한 카리스마는 없지만 게임 본연의 임무인 재미의 전달에 있어 녹스는 제 몫을 다하고 있는 작품이다.
 |
이 기사가 마음에 드셨다면 공유해 주세요
- '인디게임계의 GTA' 실크송 피해 대거 출시 연기
- 팀 스위니 에픽 대표 “에피드게임즈에 소송 의사 없다”
- 생동감 넘치는 거리, 인조이 첫 DLC 스팀서 '매긍' 호평
- [오늘의 스팀] 실크송 대비, 할로우 나이트 역대 최대 동접
- ‘세키로’ 애니 제작사, 생성형 AI 의혹 전면 부정
- 첫 공식 시즌 맞춰, 패스 오브 엑자일 2 나흘간 무료
- 돌아온 초토화 봇, 리그 오브 레전드 시즌 3 업데이트
- [오늘의 스팀] 동접 4배 증가, 데드록 신규 캐릭터 화제
- 태양의 여신 아로나, 블루아카 한정판 바이시클 카드
- [겜ㅊㅊ] 직접 시연, 게임스컴 강력 추천작 6선
게임일정
2025년
08월
| 일 | 월 | 화 | 수 | 목 | 금 | 토 |
|---|